
설레는 늙음, 서글픈 낡음 - 외목 이우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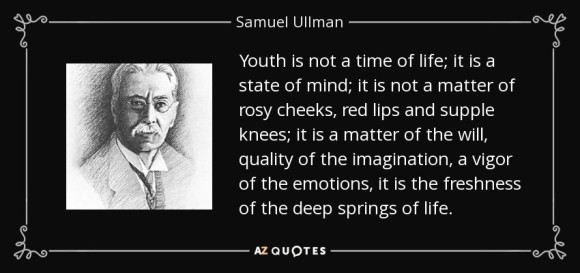
“젊음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젊음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며, 생명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다."(새뮤얼 얼먼 <청춘>)
새해가 되고 나이 한 살 또 들면 더 늙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저들의 한탄은 늙어가는 한탄이 아니라 낡아가는 한탄이다.
늙어도 낡지 않는 삶은 나이 드는 것을 한탄하지 않는다.
그 늙음 속에는 낡음이 있지 않고 이채로운 새로움이 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북극과 남극 사이만큼이나 서로 멀다.
늙음이 낡음뿐이라면, 삶은 죽어감 곧 허무나 다름없을 터… 늙으면서 낡아만 간다면, 그 끝에는 절망 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낡은 것 꼭 거머쥔 주먹을 끝내 펴지 못한 채 꾀죄죄한 인습(因習)의 구멍에서 손을 빼내지 못하는 노추(老醜), 거세게 불어닥치는 새 시대 새 바람을 애써 눈 감고 외면하는 옹고집… 수구(守舊)의 마지막 몸부림일 따름이다.
늙어가는 나이에도 젊디젊은 마음이 있다.
옛것과 새것을 한 품에 아우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은은한 지혜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어설픈 잣대를 들이대고 함부로 폄훼의 혀끝을 놀리지 못한다.
연면히 흘러온 역사의 가치, 애환(哀歡)의 삶 속에 켜켜이 박힌 연륜(年輪)의 무게를 가볍디가벼운 젊음의 짧은 삶으로 어찌 감히 비웃을 수 있으랴.
젊은 나이에도 낡디낡은 마음이 있다.
오랜 풍파를 겪어온 삶의 지혜에 두 귀 꽉 막아버린 젊음, 경직된 도그마의 사슬에 질끈 묶여버린 청춘, 우상의 손짓이 연출하는 현란한 상징조작에 넋을 잃은 청년은 나이는 젊어도 낡아빠진 퇴행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를 갈구하면서도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한갓 정신적 노예일 따름이다.
낡고 닳아빠진 늙음이나 닫히고 막힌 젊음에게는 보수도 진보도, 전통도 개혁도 모두 헛된 우상일 뿐… 우상이 제공하는 자유 속에는 흐려진 노안(老眼)이나 철없는 젊은 눈이 쉬 알아채지 못하는 새로운 억압 장치의 속임수가 감춰져 있기 일쑤다.
늙어도 낡지 않는 삶은 나날이 신선한 숨결로 살아간다.
껍데기 진보보다 더 앞선 깨우침, 입술의 개혁보다 더 싱그러운 에너지가 삶의 물길에 풍성히 출렁인다.
겉은 낡아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늙음이요, 겉이 늙어갈수록 속은 더욱 낡아가는 것이 추한 늙음이다.
기껏해야 시대의 한 단면을 서로 찢어 피 터지게 영역 다툼하는 보수와 진보의 칼날들을 유장(悠長)한 역사의 물줄기는 한낱 웃음거리로 휩쓸어갈 뿐이다.
어제의 진보가 오늘의 보수로 쇠락하고, 오늘의 보수가 내일엔 개혁의 새 날갯짓을 하다가, 어느새 다시금 끝 모를 수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역사의 눈길은 숱하게 지켜봐 왔다.
아니, 지금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역사를 들먹이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서로의 덧없는 삿대질을… 옛것이 늘 옛것 아니고 새것이 언제나 새것 아니니, 서로 다툰들 무슨 보람 있으랴.
이해와 소통으로 서로 감싸 안느니만 못한 것을…
지난해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토록 만나기를 바랐지만 끝내 만나지 못한 새해 새날들을 어찌 탄식하며 어영부영 맞을 수 있겠는가.
늙어감은 은총이요 감사할 일이다.
그 감사가 바로 ’늙어도 낡지 않는‘ 새해의 삶이리라.
낡지 않는 늙음은 은총으로 받은 새해의 삶을 한탄하며 맞지 않는다.
감동과 설렘으로 맞는다.
탄식하며 맞이하는 새해는 서글픈 낡음이요 죽어가는 나날이다.
새뮤얼 얼먼의 <청춘>처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의 설렘으로 이 한 해의 삶을 맞아야겠다.
이 우 근 (변호사 / 숙명여대 석좌교수)






